재판관은 이념(理念) 아닌 재판에 충실해야
재판관은 이념(理念) 아닌 재판에 충실해야 위한 재판은 약자에 대한 동정일 뿐 정의(正義)가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다 옳아 보여도>
오늘 조선일보에 좋은 칼럼이 있다. 이것이다. 《[기자수첩] 한 대법관의 '도그마'가 남긴 것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에 관한 글이다. 그는 지난 1일 임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재판할 때 약자라고 봐주지도 말고, 가진 이라고 더 엄격하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재판을 재판으로만 하라는 말씀이다. 약자와 소수를 위한 재판은 약자에 대한 동정일 뿐 정의가 아니다.
재판도 아니다. 그런 동정은 재판소 밖에서 베풀 일이다. 저 사람의 판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러 택시 회사가 망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을 비난하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다”
국무총리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리민복을 실현해야 맞다고 본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종교인이나 할 소리를 한 것이다. 말도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가가 해야 할 말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재판관은 유독 자기의 인간성을 내보이려고 애쓴다.
진실한 인간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데 말이다. '내가 나답지 않은' 것에서 생긴다고 본다.
정치인이. 재판관이, 교사가 종교가처럼 언동하니 나라에 불행이 잇따를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에 충실해야 하고, 재판관은 재판에 충실해야 하고, 교사는 노조가 아닌 스승 노릇에 오로지해야 한다.
정치인이. 재판관이. 교사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보다 이념에 충실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공자가 가장 힘주어 가르친 것은 충서(忠恕)라고 한다 저런 일은 충서에 반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책 읽는 철학자 렘브란트, 책 읽는 철학자, 1631년, 목판에 유채, 60 x 48 cm, 스톡홀름 국립미술관 소장.
렘브란트(Rembrand van Rijn·1606~1669)의 그림은 작은 사진으로만 봐도 왜 그를 ‘빛의 화가’ 라고 부르는지 깨닫게 된다. 어두운 실내와 밝게 빛나는 창밖 사이의 이토록 극적인 명암 차이를 물감으로 만들어 냈다니 놀랍다.
실제로 미술관에 걸려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은 흘깃 봐도 홀로 밝게 빛나서, 어딘가 조명을 감춰두고 거기에만 불을 비춘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될 정도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렇게 황금빛이 찬란한데 눈을 찌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고요한 빛을 현실에서는 본 적이 없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철학자가 있다. 돌을 깎아 만든 아치형 천장의 모서리가 닳아 무뎌졌고, 마룻바닥의 틈새가 많이 벌어진 걸 보니 오래된 건물인 모양이다.
책 위에 책을 펼쳐 놓고 독서에 몰두한 이의 모습은 건물의 나이만큼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드나들며 책에서 지혜를 갈구했던 수많은 학자를 모두 합한 상징적 존재인 것 같다.
렘브란트 시절에 ‘철학’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에 자연과학과 수학, 신학과 인문학을 모두 더한 넓은 의미의 학문이었다.
그의 눈을 밝히는 창밖의 비현실적인 빛은 햇빛을 그렸다기보다는 무지몽매한 세상을 밝혀줄 진리의 빛이자 지혜의 상징이며 신의 현현이다.
렘브란트는 일찍이 종교개혁을 거친 네덜란드에서 성장한 개신교도였으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의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성화(聖畫)를 비롯한 이미지를 우상이라 하여 용인하지 않았으나, 화가로서 렘브란트는 종교에 있어서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창밖이 저리 밝은데 빛이 어디서 오는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받은글(등대님)편집입니다!
2024.8.19.아띠할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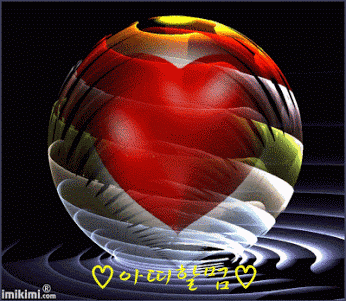
 |
카테고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