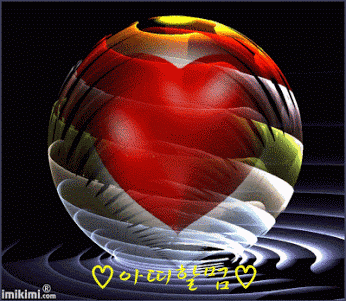‘바다의 잡초’에서 ‘바다의 채소’로 外 ‘돈 벽돌’ 쌓기
‘돈 벽돌’ 쌓기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마르크화 돈다발로 벽돌쌓기 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어른들은 빵을 사러 가면서 돈다발을 수레에 실어 나르고, 장작 대신 돈다발을 땔감으로 썼다.
요즘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인플레와 잦은 화폐개혁 탓에 휴지가 된 현금 뭉치를 벽돌처럼 쌓아 놓고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 ▶정상 국가에선 중앙은행 금고에서나 현금 더미를 볼 수 있지만 예외도 있다. 사법기관이 범죄자에게서 은닉 현금을 압수한 경우다.
2018년 중국에선 은행감독위원회 출신 부패 관리의 집에서 현금 뭉치 3t을 압수했다. 2억7000만위안, 원화로는 502억원에 이른다.
부패 혐의로 구속된 국가발전위원회 탄광부 부주임 집에서도 현금 2억3000만위안(약 428억원)이 쏟아져 나왔다. 현금 계수기가 16대나 동원됐는데, 4대는 과열로 고장이 났다. ‘김제 마늘 밭 사건’이 유명하다. 불법 도박 사업자가 5만원권 22만장(110억원)을 마늘 밭에 숨겼다가 발각됐다.
범죄자 누나가 부탁을 받고 현금 다발을 아파트 집의 김치냉장고, 다용도실 등에 보관하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마늘 밭을 사서 파묻은 것이었다.
범죄 관련 현금 뭉치는 주로 불법 도박 범죄에서나온다. 2019년엔 인천경찰청이 불법 도박 사업자에게 현금 153억원을 압수한 바 있다.
부피가 크고 악취도 심해 은닉자에겐 골칫덩이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람에게 “현금 다발을 침대 밑에 보관했는데, 악취 탓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말도 들었다.
지난해 은행 돈 3000억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경남은행 직원은 1㎏짜리 금괴 101개와 현금 45억원을 숨겨두고 있었는데, 현금 은닉 장소가 김치통이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현금 550억원을 벽돌처럼 쌓아 둔 사진이 나왔다.
돈 벽돌 무게가 총 1t이 넘는다. 수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념으로 찍어둔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이 중고생에게까지 번지면서 인터넷 해외 도박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70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전문가들은 “김제 마늘 밭이 지금도 전국 도처에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콜롬비아 마약 조직 두목 에스코바르가 죽은 뒤, 그가 은닉한 현금 수십억 달러를 찾는 사냥꾼들이 지금도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들이 다음 사냥터로 한국을 지목할지도 모르겠다. 주춘렬 논설의원
홍콩 ELS 손실 폭탄 2019년 저금리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인데 이 금리가 -0.3%를 웃돌면 연 4%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판매액이 5개월 만에 8200여억원에 달했다. 독일 금리의 급락 여파로 펀드는 반 토막(평균 -53%)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펀드도 등장했다.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투자경험 등을 따져 투자손해액의 20∼80%를 보상해야 했다. 그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피해규모 1조6700억원대), 이듬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5000억원대) 등도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됐다.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탈이 났다. 이 상품은 이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그런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 1만∼1만2000에서 움직이다 올해 들어 5000∼5600대로 추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매잔액이 작년 11월 기준 19조3000억원인데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지금 추세라면 원금손실액이 2300억원가량 확정됐고 상반기에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이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들었다”며 민원이 폭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적 투자실패와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묻되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위험 상품의 손실 폭탄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금지와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 김 수출의 역사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이 좋아 수출이지, 조선을 무단 통치한 일본이 완도 어민들에게 김 양식과 가공법을 가르친 뒤 생산한 김 대부분을 수탈해 갔다.
광복 이후에도 김은 외화벌이 1등 공신이어서 “완도에서는 개도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는 말이 돌았다.
김 최대 주산지가 지금은 고흥이다. 1978년 일본이 자국 어민을 보호하겠다며 한국산 김 수입을 막은 이후 완도의 김 양식장이 미역, 다시마, 톳으로 바뀌면서다. 김을 대규모로 생산해 상품화하는 나라는 한중일 3개국뿐인데, 우리가 세계 시장의 70%를 휩쓸며 압도적 1위를 자랑한다.
여의도의 218배 규모에 달하는 양식장에서는 중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김이 생산되는데 맛과 향 등 품질도 한국산이 우월하다.
특히 김 두께를 조절하는 가공 기술이 탁월해 얇은 김밥용 김은 우리만 생산할 수 있다. 좋은 건 밥에 싸먹는 김보다 간식용 김이다.
김부각, 김스낵, 김칩, 김스틱처럼 형태를 다양화하고 겨자, 김치, 치킨, 아보카도 등 각양각색의 맛을 입혀 나라별 입맛을 공략했다.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남미 등 120개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었던 힘이다. 얼마 전만 해도 서양에서 김을 먹으면 ‘검은 종이(black paper)’를 먹는다며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고, 맛도 좋다’며 김 사진을 올릴 정도다. ‘바다의 잡초(seaweed)’로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선 전체 가구의 5% 정도만 김을 먹는다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개척할 시장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은 바닷가에 버려진 해조류와 달리 김은 양식장에서 정성껏 키운 ‘바다의 채소(seavegetable)’라는 점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김 산업과 수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 진흥구역’도 처음 지정했다. 판매까지 도맡아 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달리 한국은 양식, 마른김 생산, 수출 등으로 분업화가 잘돼 있지만 진흥구역을 만들어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1차로 선정된 곳은 친환경 김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해남군, 충남 김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서천군이다.
최근 서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른김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거래소를 통해 입찰 방식으로 수출 계약을 진행해 김값을 제대로 받겠다는 취지다.
첫날부터 8개국 바이어들이 몰렸다고 한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김이 ‘바다의 반도체’라는 이름값을 하길 기대한다.
정임수 논설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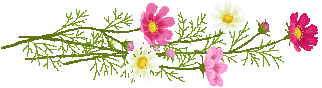 받은글(등대님) 편집입니다! 2024.1.25.아띠할멈.(). 
|
카테고리 없음